웹미디어부 송은지 부기자

내가 연세춘추 웹미디어부 기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춘추와 나의 인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세춘추>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연세(年歲) 춘추(春秋) 즉, 나이를 일컫는 말의 동어반복이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고2. 당시 춘추 기자로 활동하던 고등학교 선배의 홈페이지에 있던 사진 한 장이 나를 사로잡았다. 기자수첩을 들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선배의 사진을 보면서 학보사 기자에 대한 환상을 품었더랬지. (지금 나의 모습은 선배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이유.
인터넷 바다를 헤엄치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미니홈피 게시판에 비공개로 저장해두는 습관이 있다. 얼마 전 게시판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작년에 저장해 둔 글들 중, 연세춘추 기사가 있었던 것. 그것도 나와 같은 웹미디어부인 ‘이지숙 기자’의 기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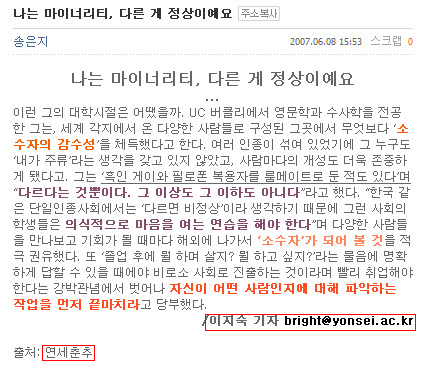
왜 신문에 네 이름 안 나와?
신문을 샅샅히 살펴보다가 결국 내 이름 찾기를 포기했다는 한 친구는 물었다. 그도 그럴것이, 맨날 취재한다 기사쓴다 오만가지 바쁜 척은 다 하는 애가 정작 내어놓은 기사는 없으니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지. 그 때마다 괜히 발끈해서는 “나는 웹진 기자라서 내 기사는 웹진에 있어. 연두 몰라 연두? 떠블유떠블유떠블유 쩜 와이오엔디오 쩜 넷. 여기 들어오면 내 기사 볼 수 있다구!” 라고 열변을 토한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웹미디어부는 정말 좋다. (마지막 문장에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그럴 수 밖에, 졸다가 써버린 문장이니까. 지울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무의식의 심연에서 튀어나온 이 문장이야 말로 나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하하)
눈-머리-손 사이엔 뭐가 있나
‘학보사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나서부터는 의식적으로 많은 글을 접하려 노력하고 있다. 남들 한 장 쓸 때 반 밖에 쓰지 못하는 나의 허접한 필력과 컨텐츠 부족에 회의를 느끼며, 남들 한 장 읽을 때 같은 줄만 세 번 읽고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나의 독서 절대량 부족을 절감하면서 다급하게 부족한 글자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글을 읽는다’기 보다는 ‘글자들을 눈으로 쑤셔 넣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다. 눈으로 들어간 활자가 머릿속에서 ‘의미’로 만들어 지는 것도, 머릿속에서 생겨난 ‘의미’가 손끝을 통해 활자로 나오는 것도 내겐 아직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읽고 쓰는 것이 원활하지 못할 땐 가끔 눈과 머리와 손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마 크노소스의 미궁 쯤 되는 미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을 해버린다. 으악. 언제쯤 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까.
더 치열하게, 더 섹시하게
대책 없이 착하기만 한 기사는 쓰고 싶지 않다. 읽으면서 독자들의 관자놀이에 힘줄이 불끈 솟고, 동공이 커지고, 가슴이 뻐근해지는 한마디로 ‘치열하고 섹시한’ 기사를 쓰고 싶다. 하지만 이제껏 내가 쓴 몇 개 안되는 기사를 읽어보면 결론이 참 착하다. 착하고 뻔해서 아쉽다. 취재 없이도 아무나 내릴 수 있는 뻔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나의 비판의식 부족, 치열한 고민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리라.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뿌려놓은 글자들은 마음이 변함과 동시에 비공개로 감추거나 지워버릴 수 있지만, 기사는 그렇지가 않다. 같은 글이지만 더 큰 책임감을 요한다. 그렇게 책임감을 껴안고 써지지 않는 기사를 짜내고 있노라면 뱃속에서 뭔가 치미는데 누군가 입을 틀어막고 있는 기분이다. 시원하게 쏟아놓고 싶은데 필력 부족으로 질질 흘리고만 있는 기분. 이거 참 답답하다. 뭐 어쩌겠어. 더 노력하는 수 밖에.

各自圖生.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지 마세요
주위에서 묻는다. 그래서 너 앞으로 기자가 되고 싶은거야? 사실 모르겠다.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은 어떤 특정 직업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래도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진짜 내가 되고 싶다’고 말하련다.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다른 무엇이 되고 싶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있어보이게' 말했지만 사실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정의하는 ‘한심한 청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그래, 나 88년에 태어난 88만원 세대다. 어쩔래! …이렇게 난 사회가 원하는 종류의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내 나름대로 변명을 해본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고 싶은건 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있다. 각자 살 길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도전, 고뇌, 방황이 각자의 살 길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법 아닐까? 사랑하고 웃고 깨지고 좌절하고 울고 다시 사랑하고…그렇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리라’는 괴테표 후레쉬를 손에 들고 오늘도 나는 활자의 숲을 헤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