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문득 ‘새로운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나올 수 있는 인사말의 유형’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대학에 입학한 이래, 2년이 훌쩍 지나도록 「연세춘추」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나로서는 떠오르는 게 단 하나다. “안녕하세요. 연세춘추 김재욱 기자(혹은 부장)입니다.” 그랬던 내가, 올 해 6월을 끝으로 2년의 학보사 임기를 마쳤다. ‘연세춘추’와 ‘기자’라는 수식어를 떼어낸 것이다.
지긋지긋하던(?) 학보사를 그만두고 마냥 즐거울것만 같던 생활도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았다. 나는 이미 심각한 공휴증(恐休症) 환자가 돼 있었고, 의미없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했다.
이러한 불안을 떨치기 위해 문을 두드린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긋지긋하던’ 신문사였다. 그렇게 해서 7월 2일부로 기자라는 수식어를 되찾았다. 바뀐 점이 있다면 「연세춘추」에서 「한국일보」, ‘학생기자’에서 ‘인턴기자’로의 변화 뿐. 아니, 출근 장소도 ‘미우관’에서 ‘명동’으로 바뀌었다.
‘인턴’ 이라는 매력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살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 1교시를 기피하던 내가 매일아침 1교시 수업을 가는 심정으로 집을 나서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요즘도 5~10분 정도의 지각은 잦다.) 어엿한 고학년의 반열에 오른 내가 학교 안에서 받았던 선배 대우(?)에 대한 미련을 뒤로한 채, '막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도 행복인 동시에 고난이기도 하다. 또한 더운 여름날, 야구장이나 도심으로 나가 땡볕을 온 몸으로 받으며 취재를 하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그렇게 취재한 내용이 더 큰 사건 등으로 인해 지면에 실리지 못한다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한국일보」 김재욱 인턴기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턴기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지난 두 달간의 기억을 더듬으니,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게 떠올라 뭘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취재했던 기사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에피소드를 하나씩 풀어놓도록 하겠다.
#1. ‘디시 인 사이드’ 네티즌의 공격을 받다
두 달간 인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단연 ‘아프간 피랍 사건’이다. 그 때문에 인턴에게도 할 일이 많이 주어졌으며, 수차례 아프간에 국제전화도 해야 했다.
(이 때 나는 꽤 많은 아랍어를 들어야 했으며, 한국말만 하면서 국제전화로 취재를 하는 요령도 익혔다.)
skill>상대방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던 개의치 않고 태연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외치면 십중팔구 한국인을 바꿔줬다. 나와 싸우기라도 하자는 듯이 끝까지 아랍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끊었다 다시 하면, 한국인이 받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피랍으로 나라가 시끄럽던 그 때, 디시인사이드 종교갤에서는 새로운 논쟁이 벌어졌으니, ‘피랍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디시인사이드를 넘어 탈레반 공식 이메일,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로 퍼졌다. 이 때, 이러한 네티즌의 악플 등을 꼬집는 기사가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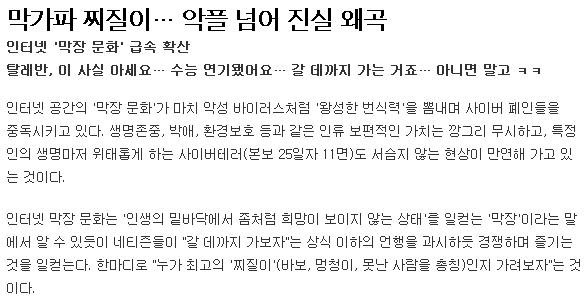
이는 곧 디시인사이드 종교갤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이 기사 쓴 인턴기자 미니홈피로 가자’는 글까지 올라왔다. 덕분에 난 며칠간 미니홈피를 닫아둬야 했다.
#2. “지금 취재 방해하는 건가요!?”
지난 7월 31일, 비정규직 해고 등의 문제로 노조가 매장을 점거한 강남 뉴코아 킴스클럽을 갔다. 추가 시위대 진입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으나, 명함의 힘으로 무난히 매장에 들어가 한창 취재를 하다 점심을 먹기 위해 30분 쯤 매장을 나왔다 다시 들어가려는 순간, 의경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명함을 내밀며)아, 저 한국일보 인턴기잔데요.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자증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여기 출입 당당하시는 분 불러주세요!”
잠시 후, 정보계장인가 하는 사람이 왔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기자증이 없는데, 명함만 가지고 당신이 시위댄지 기잔지 어떻게 알아요? 못 들어갑니다.”
“명함 말고, 뭘 어떻게 더 증명을 해요! 이거 악의적으로 취재 방해하는 거 아니예요!? ”
‘악의적 취재 방해’라는 말에 부담을 느낀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저지선은 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시위대가 가로막았다. “기자 맞아요? 명함 위조해서 들어오려는 경찰 아니예요?”
“(이제 겨우 22살인데, 어딜 봐서 경찰로 보이나요ㅠㅠ) 아녜요, 전 한국일보 인턴기자가 맞답니다. 회사에 전화라도 해보실래요?” “음, 한국일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J사, J사, D사 기자는 안 들여보내주고 있거든요.”

매장에 들어가느라 힘을 다 뺀 나는 여느 노조원과 같이 박스를 깔고 누워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배운 낯익은 민중가요를 따라 부르다, 옆 사람으로부터 “어느 매장에서 일하고 있냐”는 질문까지 받았다.
그래도, 민중가요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에 손쉽게 멘트를 따고,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아직 풀어놓을 이야기보따리는 많은데, 분량을 한참 넘어서서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글의 야마(やま, 주제? 핵심? 하고자 하는 말? 목적? 따위의 의미로 쓰임)가 뭐야?” 라는 선배 기자의 다그침이 머리를 스친다. 야마가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할텐데..
/김재욱(사회·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