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독립서적,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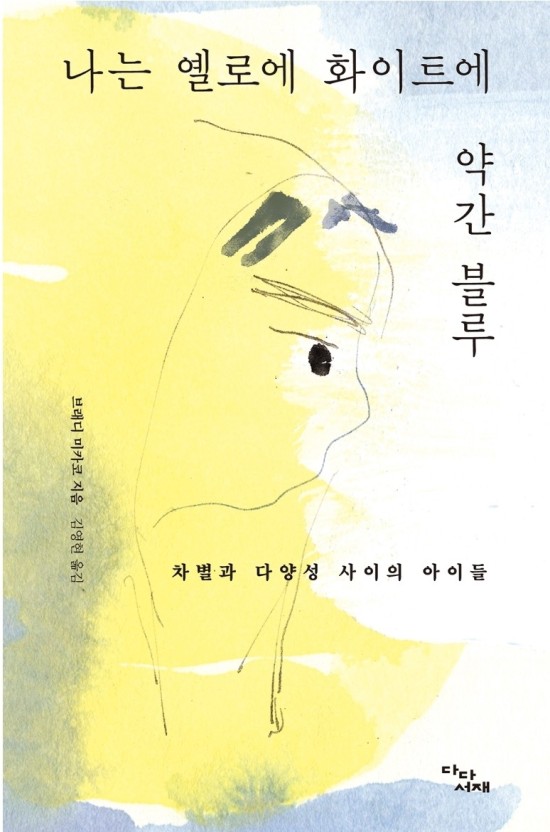
다양성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차별도 커진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차별에 더 익숙한 듯하다. 브래디 미카코의 책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는 이런 사회에 특별한 메시지를 던진다.
"사회에 다양성이 더해지면서 인종차별의 양상 또한 늘어나고 복잡해졌다.
이민자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도 그 속에는 온갖 인종이 있고 출신 국가도 제각각 다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저자의 중학생 아들이다. 아들은 서로 다른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들은 학교에서 인종도 계층도 다른 친구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는 차별로 인한 여러 사건을 겪는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은 백인 노동자 계급의 학생들을 만난다. 그들은 아들에게 ‘칭챙총’이라며 놀리기 시작한다. 아들은 이에 맞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차별은 가끔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일상’이다.
책 제목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는 아들이 공책에 써놓은 문장이다. ‘옐로에 화이트’는 아들의 피부색을 의미한다. ‘블루’는 우울을 뜻한다. 아들은 인종차별로 인한 슬픔을 블루로 표현했다.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인 아들은 오늘도 차별과 다양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아들의 학교에는 수많은 이민자가 다닌다. 그들은 이민자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도 인종도 생활양식도 모두 다르다. 하나의 정체성만을 지닌 사람은 없다. 차별을 대하는 태도도 제각각이다. 한 친구는 차별을 회피한다. 차별을 차별로 갚아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친구도 있다. 반면 아들은 다양성을 무기로 내세워 차별에 맞선다.
다양성은 종종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해석된다. 왜곡된 다양성은 세상에 분쟁과 고통을 심어줄 뿐이었다. 저자는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원래 다양성이 있으면 매사 번거롭고 싸움이나 충돌이 끊이지 않는 법이야.
다양성이 없는 게 편하긴 하지.”
“그렇지만 편하려고만 하면 무지한 사람이 되니까 다양성은 필요해.”
무지한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무지는 차별을 불러온다. 무지와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심퍼시는 감정 또는 행위 또는 이해지만 엠퍼시는 능력인 것이다.
자신과 이념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 또는 그다지 가엾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상해 보는 능력인 것이다.
심퍼시가 감정적 상태라면 엠퍼시는 지적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아들은 ‘엠퍼시(Empathy)’를 배우며 성장한다. 비로소 다양성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심퍼시(Sympathy)와 엠퍼시는 모두 ‘공감’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둘의 실제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심퍼시는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인 반면 엠퍼시는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러나 능력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스스로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아들이 학교 시험문제 ‘엠퍼시란 무엇인가’에 쓴 답이다. 이는 타인의 입장에 서본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큰 신발을 신으면 벗겨지기 마련이다. 작은 신발을 신으면 몇 걸음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발이 아프다. 그렇기에 타인의 신발을 신기 위한 노력은 엠퍼시로 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엠퍼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포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를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배척만큼이나 시혜적인 포용 역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학교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아이가 있다. 하루는 아프리카 여성 할례에 관한 수업이 진행됐고,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모두 그 여자아이를 동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정은 여자아이에게 불편함과 거북함으로 와닿았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퍼시가 아닌 엠퍼시이다.
책의 끝 무렵 아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장을 제시한다.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그린’ 그린은 미숙함 혹은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아들은 다짐했다. 차별에 무기력해지지 않기로. 그리고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아직은 어리숙하지만 차별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옐로에 화이트인 아이가 꼭 블루일 필요는 없다. 또 그린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다. 아들이 블루에서 그린으로 변한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색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러분은 블루인가, 그린인가. 차별에 머무를 것인가, 다양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차별보다 존중이 더 익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공감(Sympathy)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능력(Empathy)이 필요하다.
글 강하영 기자
kang_hayeong@yonsei.ac.kr
<자료사진 yes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