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에 100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타고난 이야기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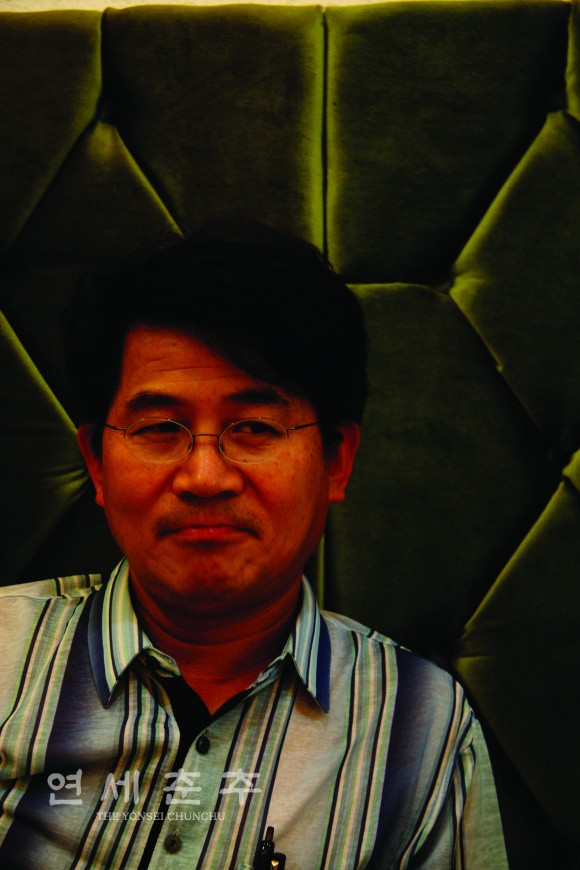
소설가 성석제의 글은 독특하다. 대부분의 작품에선 조폭, 노름꾼, 졸부 같은 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날카로운 비판 대신 재치 있고 허를 찌르는 해학과 풍자가 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질문하는 듯싶다가도 곧 황당한 비유와 과장으로 우리가 단지 그가 지어낸 이야기를 읽고 있을 뿐임을 각인시켜 준다. 그의 소설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그래서 읽는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드는 글인 셈이다. 지난 여름 그의 집필실 근처에서 만난 성석제는 그의 소설만큼이나 ‘웃기는’ 이야기꾼이었다.
문학에 발을 들여 놓다
법학도였던 대학 시절, 그는 ‘연세문학회’ 회원이었다. 고(故) 기형도 시인을 비롯해 당시 그와 친했던 사람들 중에는 시를 쓰는 사람이 많았다. 그 때는 꼭 문학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인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다 군 입대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문화와 예술에 관한 역사책, 문학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제대 후에는 본격적으로 문학적 소양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읽기에 더 매달렸는데, 이는 친구인 고(故) 기형도 시인의 권유가 한 몫 했다. 그는 그 때 읽은 책들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했고, 때문에 ‘진정으로 와 닿는 무언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문학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지난 1984년 처음 쓴 시 「고 이대복」으로 윤동주문학상 가작에 당선됐다. “『연세춘추』에 시랑 함께 실린 심사평이 운명을 바꿔놨지. ‘꾸밈없는 표현 속에 마음의 진솔함이 드러난다’는 평이 매우 인상적이었거든.” 이듬해에는 소설 「함정과 끈」으로 박영준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가 들려준 뒷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이 상을 휩쓸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큰소리 떵떵 치면서 희곡, 소설, 시 모두 원고를 냈지만 소설만 당선되고 말았단다.
삶에 가득 찬 이야깃거리들
그는 졸업 후에도 문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연히 선배가 근무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권유에 ‘이왕이면 문학과 관련 있는 곳에서 일하자’ 싶어 출판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본래 떠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방랑자적 기질이 있는 터라 결국 일을 관두고 ‘문학수업’ 격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떠돌며 보낸 시간 동안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인간 유형을 만났고, 그 때의 경험이 그의 문학의 기반이 됐다. 그는 세상에 참으로 여러 존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작품을 통해 삶을 그려내자는 생각을 했다. 그의 소설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는 주인공이 자동차 사고로 다리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4.5초 동안을 그린 작품이다. “엄마, 무서워”란 말로 끝맺는 이 소설에서 그는 특유의 발랄하지만 뼈 있는 시각으로 주인공의 지난 삶을 한바탕 훑는다.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4.5초에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지 묻자, “사실은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셈”이라며 운을 뗐다.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신촌 로터리에서 종합관까지 시간이 아슬아슬한거야. 지금부터 계속 뛰어도 늦을 것 같으니까 결국 수업은 포기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를 탔지. 우이동 종점에서 내려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물이 흐르는 길이라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 그 때 절벽에 매달려서 여러 생각을 했지. 지금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잘 모르겠어.” 그는 존재 자체를 살려내려는 제3의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다. 절벽에 매달렸던 경험이 소설가로서의 운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경험 덕분에 적어도 소설 2편은 건졌기 때문이란다.
“원래 천성이 낙천적이라…”
그는 「유리 닦는 사람」이라는 시로 등단했지만 지금은 주로 시가 아닌 소설과 산문을 쓴다. “내가 시를 배울 당시에는 서정시가 주류였어. 그 때의 서정시는 고독, 자기성찰, 슬픔을 담아내는 순수한 언어의 축제였지. 배운 대로 하긴 했지만 나한테 썩 잘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가 시에서 소설로 ‘전향’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단지 자신이 쓰고 싶은 문학은 시라고 하기엔 좀 무겁고, 불순하고, 통속적인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라는 광산이 있으면 광맥에서 나오는 진짜 시는 조금밖에 안되지만, 그 옆에 찌꺼기가 수십 배는 돼. 그것들을 산문으로 정리해 보니 책 한 권 분량이 나왔고, 그게 첫 소설집이 된 거지.”
작품의 분위기도 매우 달라졌다. 쓸쓸함이 묻어나는 시와 달리 그의 소설에는 소리 내어 웃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난 1994년에 데뷔작으로 발표한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보면, ‘하헤히호후후히힛헤헤이히히픽아하하…’하고 웃음소리를 직접 묘사한 글이 있다. 옆에는 ‘반드시 따라 읽어야 효과가 있음’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놓았다. 그는 자신이 시에서 소설로 옮겨가던 과도기에 그 작품을 썼다. 가벼움 속에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문학적 시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인 셈이다.
그는 자신이 원래 낙천적인 편이라고 했다. “농촌 출신이다 보니 나무, 숲, 들과 같은 자연의 은혜 속에서 자란 것 같아. ‘촌’에 대한 내 또래의 향수는 다 비슷할 걸.” 작품에 쓸 웃음의 소재는 어디서 찾느냐는 질문에 “원고 청탁을 받은 후엔 재밌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지. 특히 마감이 가까워오면…”이라며 그다운 대답을 했다.
나는 작가, 나만의 성(城)을 쌓는 중
그의 작품이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닌 것이, 미묘하다. 이런 류의 글을 포함하는 장르가 있을 테지만, 어떤 틀에 매이는 글을 쓰기는 싫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자신의 글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장르를 새로 만들고 싶지도 않단다. “작가는 새로워야 해. 내가 연대를 나와서 그런가…(하하). 나는 기질적으로 매이기 싫어해. 무언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살면서 이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지켜 왔어.”
그에게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냐고 묻자, ‘기존의 틀에 관계없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연암 박지원이나, 벽초 홍명희, 중국의 루쉰, 독일의 베르톨트 브레히트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은 작가 자신이 하나의 국가, 성(城)을 이룬다고 했다. 그의 소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는 ‘기존의 소설과 다른 문법’을 쓴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소설’도 각각은 그 나름대로 새로운 것이라고 했다. 본래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문법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모든 작가들이 자기만의 성(城)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나도 좋아하는 작가들은 있지만, 그들과 똑같이 쓸 수는 없고 그렇게 쓰기도 싫어.”
인터뷰 말미에 그는 “많은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많은 것’에는 진리 외에도 사랑, 인생에 대한 절실함, 자존감, 자립심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상관없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는 문학과, 자연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자유로워진 인간이 아닐까.
글 황이랑 기자 oopshucks@yonsei.ac.kr
사진 정석현 기자 remijung@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