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이민성 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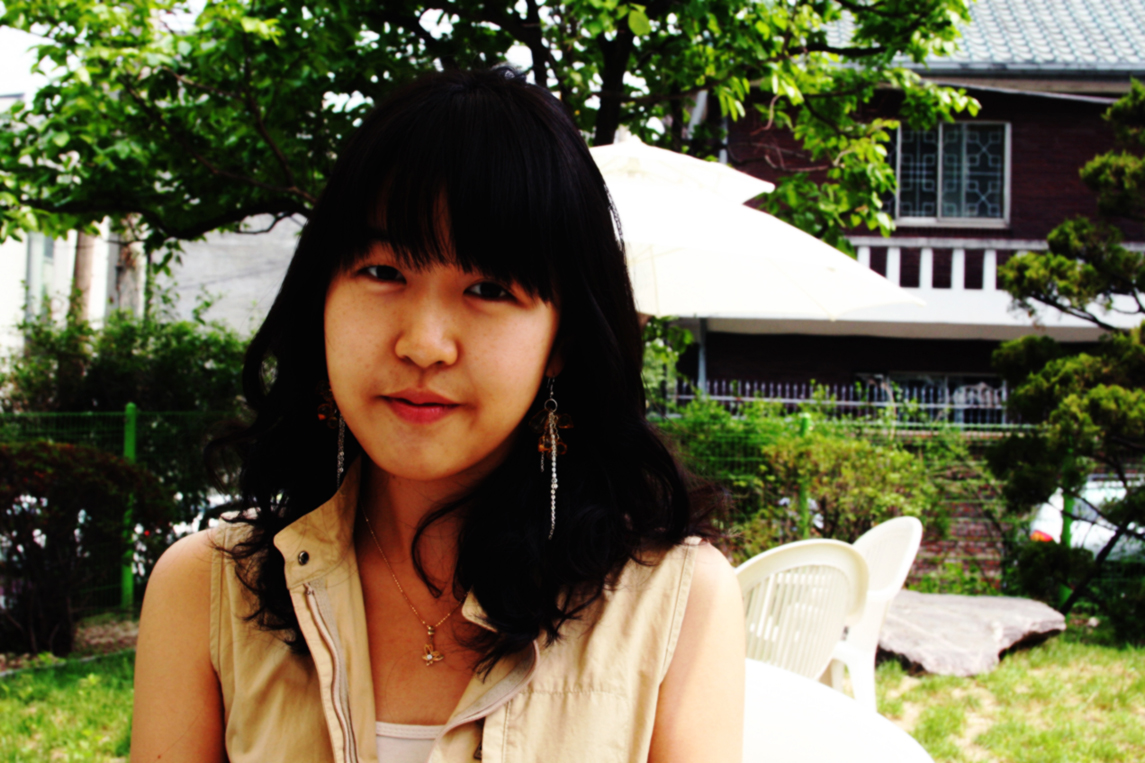
다 큰 대학생 자녀들을 과보호한다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과연 이것이 현실의 적절한 반영인지, 수박 겉핥기식 취재를 통한 과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조사를 내 손으로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취재를 하기로 결심했다.
세부적인 취재계획을 세운 후, ‘헬리콥터 부모’들을 둔 학생이나 이런 현상을 대학사회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학교 내 여러 군데의 기관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지만 취재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 조언을 구하며 정보를 모았다. 계속되는 전화 및 현장취재 후 ‘헬리콥터 부모’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사를 쓰는 과정도 난항이었다. ‘헬리콥터 부모’의 치맛바람은 분명 대학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지만, 이것을 마치 대다수의 학부모의 모습인 양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칫 내 기사가 몇몇 일간지들처럼 일부의 현상을 과장해서 보도하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에 조심스러웠다. 최대한 무리한 일반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기사가 나간 후, 오랜만에 독자로부터의 메일을 한 통 받았다. 한 학부모가 보낸 글이었다. 기사를 읽은 후 느낀 점이 많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블로그에 스크랩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길지 않은 글이었지만, 누군가가 내 기사를 읽고 공감을 했다는 사실에 참으로 오랜만에 기자로서의 뿌듯함을 만끽했다. 사실 그간 계속되는 바쁜 업무에 치여서인지, 처음 내 이름을 내건 기사가 나왔을 때의 두근거림 같은 긴장감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쓰는 글들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새삼 학생기자로서의 의무감을 느낄 수 있었다.
2006년 1학기 제작도 이제 한 번 남았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기자비망록이 이번 학기 ‘이민성 기자’라는 내 이름을 달고 나가는 마지막 기사이기도 하다. 취재는 끝났지만, 기자로서 내가 느낀 감동과 사명감은 내가 연세춘추를 나가는 그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The show must go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