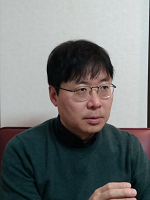
가을이 천고마비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다 흘러간 옛말이다. 2019년 가을은 미세먼지가 점령하고 돼지열병이 걱정되는, 책을 읽지 않는 시대다. 한 마디로 격세지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학을 읽고 쓰지 않을 수 없다. 시는 꿈이요 소설은 허구이니 비현실적이라고 단죄할 수는 없다. 현실이 각박할수록 문학은 빛을 발하는 법이기도 하다. 한 줄의 산문이 갇힌 자에게 희망을 주고, 한 줄기 시가 인생을 살리기도 한다. 어느 작가의 무덤 앞에 놓인 메모지에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독자의 고백이 적혀 있기도 했다.
최근 우리대학교에 손님이 한 분 오셨다. 이스마일 카다레가 그분이다. 팔순 넘은 알바니아 출신 문학가는, 망명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문학의 일부를 쓰고 있는 거장이다. 처음에는 시를 썼고 나중에 소설을 쓴 이 문인의 작품은 잘 읽힌다. 언어에 연결된 사고가 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깊이 모를 질문들을 던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관습이 우리에게 실제로는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 물음을 선사한다. 한 번 읽으면 손에서 놓기도 어렵지만, 놀람을 주는 대목들 때문에 계속 읽기도 어려운, 모순적 독서 경험을 카다레의 세계도 전해준다.
만산홍엽. 그리고 만산낙엽. 가을은 우리에게 모순적 경험을 앓게 하는 문학 텍스트 같다. 이 순간이 지나면 세상은 백색 캔버스로 바뀌고, 봄의 전령들이 한 점 한 점 색을 떨어뜨릴 것이다. 모두 창조주가 그렸을 태고의 풍경만 같고, 문학은 그런 풍경을 읽어내거나 창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길러준다. 문학에 침잠했다가 돌아오는 독자와 작자의 마음에는, 세계의 풍경이 들어있게 돼서, 그 풍경을 확대해 세상을 읽고 쓰게도 되지만, 문학의 장점은 동시에 자유를 준다는 데도 있다.
문학을 너무 좁은 개념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은 18세기의 산물인바 시대를 넘어서면 문학 개념은 광활하다. 철학서도 문학이고 우주론도 문학이다. 일언(一言)으로, 모든 책은 문학일 수 있다. 무엇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읽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무엇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쓰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문학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어서 소중하다는 말도 있다. 수평선도 지평선도 쓸모없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문학이 왜 쓸모없겠는가. 문학의 효용은 여기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날 이후 남은 것들(The remains of the day)』의 집사 스티븐스는 말을 잘 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말한다.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실존적 토로나 “오 로미오 당신은 어째서 로미오인가요!” 라는 줄리엣의 애절한 비명은 한 가지(支) 문장이 어떻게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지 시간을 거스르며 보여준다.
한 사람은 하나의 한계 상황이다. 타인의 문학을 걸어 간접 경험하는 세계는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해 한 사람을 많은 사람이게 해준다. 문학이라는 길은,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방적 태도를 후천적으로 갖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프루스트가 말했던가. 나에게 당신이 읽은 책을 알려주면 나는 당신에 대해 알려주겠노라고. 윤동주 시인이 사랑한 프란시스 잠의 시의 일부를 같이 읽어보자.
구월 - 폴 클로델에게
구월은, 바람이 부는지 보기 위해
사각모를 쓴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균형의 법칙을 따른답니다.
구월에는
바다 위에서 배들이 춤을 추고
넘어지지 않고. 책들은 추분(秋分)에 대해 말한답니다.
나는 이런 책도 읽었는데요
일식들과 별자리들과 썰물들과
모순들이
구월의 세상을 설명해준다는 책이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