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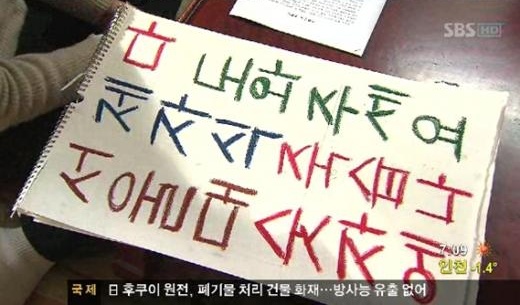
지난해 11월 서울대 공대에 합격한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 아이 합격 좀 취소해달라’고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유인즉슨 ‘수능에서 의대 갈 점수가 나왔기 때문’이란다. 서울대 수시 최연소 합격생이라고 화제를 모았던 한 학생은 결국 우리대학교 치과대학에 진학했다. 여러 언론에서 ‘천하의 서울대가 굴욕을 당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웬만한 지방대 의대 점수가 서울대 공대 점수를 넘어선지 오래고, 전국 수석이 서울대 물리학과로 진학한다는 말은 이제 고문서에서나 찾아볼 법하다.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해서 이공계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 때문에 2학기면 사라지는 반수생들이 허다하고, 이공계 건물에는 ‘MEET/DEET/PEET’ 전문 학원 ‘메가MD’ 포스터가 도배돼있고, 독서실에서는 오는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막차를 타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인지, 결과적으로 전공을 살려 그 방면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결국 소수에 불과하다.
흔히들 이 모든 ‘이공계 기피 현상’은 1990년대 말에 있었던 IMF 대란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당시 우리나라에 IMF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이공계 연구원들은 대거 해고됐고, 벤처 산업은 몰락했다. 뼈 빠지게 공부해서 대기업 취직해봐야 지방 근무에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서른 중반 넘어가면 책상 없어질까 휴가도 못 간다는 말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기정사실로 치부되고 있다.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이공계열 연구원 대신 의사, 약사, 변리사 등 전문직과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뚜렷해졌다. 포스텍을 수석 졸업하고도 “이공계에서는 박사학위를 따도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서울대 의대로 편입한 김아무개씨의 사례가 이공계 기피 세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 하다.
의사 등 전문직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IMF 직후에 있었던 ‘의약 분업, 의료파업 사태’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수차례의 진료수가 인상을 감행했고, 이는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용인해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나 또한 이공계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다.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에서 ‘길게 공부할 거면 집이 잘 살거나 마누라를 잘 만나야한다’ 따위의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대한민국 이공계의 현실이다. 열심히 공부해봐야 봉급도 적고, 사회적으로 명예롭지도 않으며, 매일매일 해고의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비정규 계약직 시한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과거 경제 고도 성장의 동력에 이공계 인력이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의 힘으로 지금의 위상을 이룩한 나라다. 정부는 이공계 현실 개선을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한다. 지금과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몰락한 동북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돼있을 것이다.
김종혁 기자 black_hole@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