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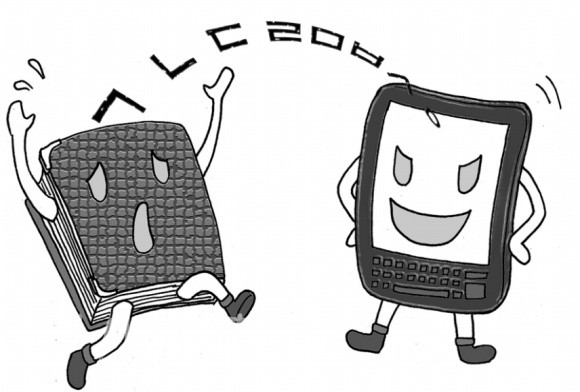
최근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 3’가 출시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언제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전자책의 가격은 9.99달러로 파격적인 가격이다. 전자책의 위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책을 출판할 때 출판업계에 인쇄를 의뢰한다. 인쇄비용을 작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책을 출판할 땐 인쇄과정을 생략해도 된다. 게다가 일인 출판을 하는 과정 또한 간단하다. 작가가 원고를 완성하면 그것을 PDF파일이나 MS Word파일같이 리더기에 읽힐 수 있는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면 된다. 그리고 일종의 도서 주민등록번호인 ISBN이라는 코드를 받고 업로드를 하면 책이 완성된다. 즉, 작가는 책을 출간할 때 굳이 출판업체라는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자책에 있어서 이러한 인쇄의 불필요성은 출판업계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인쇄과정이 생략되면 책을 하드카피로 찍어서 팔 때보다 가격이 1/3가량 저렴해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점차 전자책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출판업계는 이러한 동향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보문고는 KT와 제휴해 전자책 제작·전송에 급히 뛰어들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와 알라딘 역시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 출판업계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는 “이제 출판업계가 책의 컨텐츠, 전자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리더기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게 돼 출판업계의 덩치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자책이 등장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적인 문제도 있다. 바로 ‘디지털화권’ 이다. ‘저작권’이 컨텐츠를 만든 제작자가 갖는 권리라면, 이 디지털화권은 전자책 등 다른 컨텐츠를 처음으로 디지털화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권리를 통해 이미 디지털화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타인이 전송 혹은 복제할 수 없고 권리자만이 그 결정권을 부여받는다. 이 권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경우 그 쓰임이 무궁무진해 가치가 올라간다는 데 있다. 디지털화권을 보장해준다면 자료의 디지털화 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이책은 죽었다.” 미래학자이자 MIT 미디어랩 교수인 니컬러스 네그로폰테가의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종이책의 죽음을 고할 만큼 전자책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조상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역시 “우리나라도 전자책의 보급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수요·공급이 적어 전자책에 대한 정책의 성과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자책 시장의 규모가 이미 1조원을 돌파했음을 감안할 때 전자책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전자책과 종이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자.
임서연 기자 guiyoomi@yonsei.ac.kr
그림 김진목

